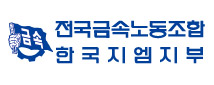급성장하는 노동조합, 그리고 '고객화 된 조합원'님들
작년 말 이후, 노동조합 가입자가 급증했다.
특히 젊은 조합원들의 유입이 두드러졌는데, 여러 소규모 노조들에서 조합원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들이 나타났다.
문제는 급성장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없이 가입한 일부 조합원들이 조직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러 노조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규정의 자의적 해석: 조직 운영의 일반적 관례를 무시하고 규정 조문만을 문언 그대로 해석
-전체 맥락 무시: 여러 조항 간의 관계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으로 접근
-소수의 횡포: 규정상 필요한 동의 인원에 크게 못 미치면서도 조직 전체를 좌지우지하려 시도
-외부 압력: 내부 문제를 상급단체에 직접 신고하며 조직 외부의 힘을 빌려 압박
-이중잣대: 평소 투명성과 민주성을 요구하다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비공개를 요구
내 생각에 핵심은 이들이 자신을 '고객'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조합원의 의무는 망각한 채 권리만 주장하고, 집행부를 서비스 제공자처럼 대한다. 집행부의 사소한 실수를 끊임없는 논쟁거리로 만들고, 자신들을 피해자로 포지셔닝해 여론전을 벌인다.
아이러니한 건,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민주노조 운영원리"라고 포장한다는 점이다. 규약과 규정조차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민주적 절차"를 운운하고, 소수의 목소리로 다수를 압박하면서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규칙과 절차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이들은 그 기본조차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급단체의 힘을 빌어 자신들의 문제제기를 관철시키려하며, 이 과정에서 상급단체 담당자조차 서비스 제공자처럼 대한다.
더 문제는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자신들을 '현장파'라 여기며, 행정업무에 매몰된 집행부를 '관료주의'라고 비판한다는 점이다. 노동조합 업무에 얼마나 많은 행정업무가 있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노동조합 업무를 하다보면 국세청을 비롯 각종 행정관청과 해야하는 업무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소규모 조직에서 집행부가 본업을 수행하고 남는 시간에 조합활동을 병행해야 하고, 전임자 없이 적은 활동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의 문제제기로 행정업무가 폭증한다는 거다. 결국 이들의 문제제기로 인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연대투쟁에 참여할 여력이 집행부에게는 남지 않게 된다.
물론 이는 2030세대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조직의 임원들도 2030세대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급성장 과정에서 조직 문화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유입된 일부 조합원들의 '소비자 마인드'다.
노동조합은 서비스업체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조합원 모두가 주인이자 운영자다. 권리만큼 의무도 있고, 비판만큼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급성장하는 조직들이 겪는 성장통이겠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조직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